-니르바나 오케스트라 29회 정기 연주회 관람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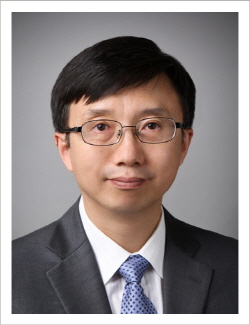
2021년 10월 26일 저녁 7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 불교계의 유일한 오케스트라단(團)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29회 정기 연주회를 다녀왔다. ‘부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강형진단장이 지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힐링 코러스와 함께하는 공연이다. 20여 년 이상 오케스트라단을 이끌어 온 강 단장은 이번 공연 준비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4년 만에 개최되는 공연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강 단장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모습이 상상되어 공연을 모두 마친 후 강 단장이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과 연주자, 합창단을 향해 큰 절을 올릴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왔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 그녀는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강 단장과의 인연을 10여 년 이상 이어오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다. 아무 걱정 없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이 일을 놓지 않고 이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니르바나’의 의미는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번뇌가 소멸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로 열반(涅槃)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몸을 지닌 인간이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단순한 생명유지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남보다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 주변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욕망의 시점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다. ‘지금-여기’를 벗어나 있다. 욕망의 불이 꺼지기 위해서는 ‘지금-여기’에 머무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여기’에 머무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순간이며, 동시에 이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니르바나’는 음악을 통해서 ‘깨달음의 추구’라는 큰 발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과 중생 교화의 방편이다. 다양한 악기가 몸으로 내는 소리를 들으며, 합창단과 성악가의 음성 공양을 들으며, 지휘자의 몸짓을 보며 우리는 ‘지금-여기‘에 머물게 된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수행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깨어있음(자각)과 몰입(집중)이 수행의 양 날개이다. 깨어있음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이다. 깨어있어야 알 수 있다. 바로 성성(惺惺)이다. 몰입은 지금 하는 일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비록 외부세계는 시끄러워도 내면세계는 늘 고요하다. 바로 적적(寂寂)이다. 연주자, 지휘자, 합창단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자신과 악기, 노래, 지휘가 분리되지 않고 자신이 악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지휘가 된다. 하는 일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청중은 악기와 노랫소리를 들으며 또 지휘자의 몸짓을 보며 ‘지금-여기’에 머물게 된다. 음악을 통해서 연주자나 청중 모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강 단장은 음악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연주자나 청중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음악을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그녀 역시 고해를 건너고 싶어서 또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건너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이다.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명진언‘으로 ‘부처를 노래하다’라는 음악의 장이 열렸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가 노래하다’가 아니고 ’부처를 노래하다‘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불자들은 만트라를 외우거나 정근을 하며 자신의 발원을 기원한다. 그런 면에서 ’부처를 노래하다‘는 부처를 노래하며 부처가 되고 싶은 염원을 담은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내려 본다. 광명진언을 외우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한다. 업장소멸은 바로 깨달음이다. 첫 연주를 통해서 강 단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염원을 토해내고 있다. 오케스트라단을 설립한 취지와 오늘 공연의 목적을 ‘말 없는 말‘로 표현해내고 있다. 무대가 열리기 전에 범종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첫 곡은 악기로 표현한 새소리로 시작된다. 범종소리와 새소리는 우리를 깊은 산속으로 안내한다. 처음에는 조용히 음악이 흐르다 경쾌하게 바뀐다. 가벼운 경쾌함이 아니고 진중한 경쾌함이다. 격동이 몰아치고 다시 차분히 가라앉는다.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한 광명진언을 음악으로 염송하고 있다. 우리에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경책의 외침이며 동시에 안타까운 연민의 표현이다. 이 공연은 첫 곡으로 이미 끝났다. 그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기만 했다. 기타와 피아노 연주, 성악가의 노래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오케스트라의 합주 덕분에 솔로 연주와 노래는 더욱 풍성해졌다. 오케스트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연주와 노래를 빛내기 위해 조용히 받쳐주고 있다. 요즘 세상은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오늘의 이 연주를 보여주며 드러내지 않는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할 일을 대부분 마친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합창 공연도 인상적었다. 그들은 불교 음악의 전파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사찰에 가서 찬불가를 지도하며 멋진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다. 노래를 통한 아름다운 보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을지로 입구에서 매주 노숙인을 위한 음식 공양을 10여 년간 했던 분이다. 음식 나눠드리기 전에 합장 반배를 한 후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음식을 나눠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셨던 자원봉사자들 얼굴도 떠올랐다. 강 단장도 연주회 마칠 때 나타나서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큰 절만 올리고 무대를 떠났다. ‘침묵의 언어’가 큰 소리보다 더 큰 반향을 만들어 낸다.
공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연주자와 가수, 합창단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꺼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불자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기대한다.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