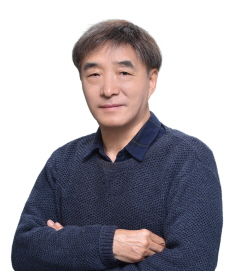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11월 11일이‘농업인의 날’로 정해진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한자로 土月土日은 흙 토(土)자를 십(十)과 일(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이날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다. 많은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이날 가래떡을 만들어 방문하는 농업인들과 나눠 먹으며 그 뜻을 함께하고 있다.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로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농업인의 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빼빼로데이보다 훨씬 이전에 생겼음에도 말이다.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데이대로 즐기면서 농업인의 날이란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더위가 극심했다. 그리고 더위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가을장마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때가 되니 농촌에는 황금 들판이 펼쳐지고 과수원에서는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콩은 여물고 배추와 무도 실하게 자라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를 이겨내고 잘 자라 준 벼와 사과나무와 콩과 배추와 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는 농업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상변화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농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때마다 농업인들의 입술은 타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농사를 지어 객지로 보낸 아이들의 학비를 대며 농자재값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나 더 맛있고 더 몸에 좋은 농산물을 찾아 먹는 이 시대에 언젠가는 식량이 부족해 돈 주고도 못 사 먹을 수도 있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전쟁이 빈번한 전 지구적 현상을 볼 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로든 곡물 수출국이 자국의 곡물을 무기화하거나 작황 부진으로 수출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석유 파동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선진 강국들은 식량 자급률이 높다. 대부분 식량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식량 자급률이 46%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곡물 자급률은 22.3%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해온다는 이야기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곡물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안정선까지 곡물 자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시대다. 유사시를 대비해 다각도의 식량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국내 농업기반의 안전화 대책도 구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농가 인구도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 약 280만 명이던 농가 인구수가 2023년에는 80만 명이나 줄어 겨우 2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2023년 기준 농가 인구수의 52.6%가 65세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디지털 농업의 육성 등 농업 농촌에 대한 많은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장 저위 산업이 농업이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곳이 농촌이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근간 산업이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목숨줄이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농업과 농촌을 생각해본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