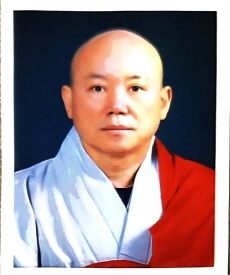
출가자의 길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행위로만 설명할 수 없다. 붓다가 제시한 길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교공동체를 지탱하는 책임을 함께 포함한다. 출가자는 탐욕과 번뇌를 끊고 청정한 삶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일 뿐 아니라, 신도와 사회를 이끄는 스승이자 지도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승려의 삶은 개인적 해탈과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무거운 길이며, 그 무게는 곧 승가라는 불교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첫째, 계율은 단순한 금지 규범(規範)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욕심, 분노, 무지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 틀이다. 승려가 계율을 성실히 지키는 것은 불교공동체의 신뢰와 도덕적 권위를 지키는 핵심이다. 만약 계율이 무시된다면, 개인 수행은 물론 불교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청정한 계율 준수가야말로 승려 존재의 근본이며, 이는 곧 승가 공동체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청정함은 출가자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출가자는 법문을 설하는 스승이기 이전에 수행자로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좌선과 염불, 경전 독송과 명상은 수행자의 일상이자 불교 수련의 본질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모범이 되는 삶이다. 승려가 자기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신도에게 전하는 말은 공허해지고, 종단 운영도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셋째, 승려는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는 교화의 사명을 지닌다. 절은 단순히 승려 개인의 수행처가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의 안식처이자 사회 교육의 장이다. 승려는 설법과 상담, 의례 집행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포교를 펼쳐야 한다. 교화의 본질은 자비와 공감이며, 이는 시대와 사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넷째, 승려는 개인 수행자일 뿐 아니라 종단 제도와 운영을 지탱하는 구성원이다. 청규(淸規)를 따르고, 종헌(宗憲)·종법(宗法)을 존중하며, 필요한 행정과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실천이다. 불교는 제도적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만약 승려가 공동체의 의무를 외면한다면 종단은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승려의 의무는 사찰 울타리를 넘어선다.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 고령화와 같은 문제 앞에서 승려는 중생의 곁에 서서 희망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봉사와 교육, 대화와 연대는 곧 수행의 연장이다. 자비는 불교의 생명이자 본질이며,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실현하는 것이 출가자의 책무이다.
결국 승려의 의무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정한 삶을 지키는 것이며, 둘째,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깊게 하는 것이다. 셋째, 중생을 향한 자비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이 있으며, 넷째, 불교공동체를 위한 종단 운영과 제도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회적 문제 앞에서도 봉사와 교육,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봉사의 의무를 다한다. 이 모든 의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출가자의 길을 완성한다. 출가자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선택을 넘어 불교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걸어가는 자비와 청정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대구 기원정사 주지ㆍ불교문예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