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 정착된 과정 면밀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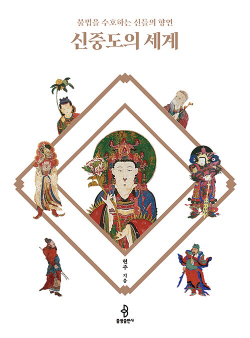
신중도의 세계
현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값 35,000원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善神)들의 세계, 우리나라 신중도(神衆圖)를 본격 탐구한 최초의 연구서가 출간됐다.
사람들은 특유의 색감이나 등장하는 신들의 험악한 인상 때문인지 사찰 신중도를 무속화(巫俗畵)나 무신도(巫神圖) 정도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신중도는 불법을 지키는 선신들의 군상으로, 불교 교단을 수호하고 중생을 돕는 존재인 신중의 집합적 초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중은 “부처님이나 보살, 나한보다 아래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욕망을 지닌 존재”로 신도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친밀성 때문에 신중신앙은 불교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졌으며, 중국과 한국 등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민간신앙까지 수용 확산됐다. 이에 저자는 신중신앙의 산물인 신중도를 “가장 서민적이며, 개방적인 불화”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신중신앙의 성립과 전개, 신중도 성립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례와 도상, 개별 화사, 또는 개별 지역 양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중도가 어떻게 조성돼 왔으며, 불단의 필수 불화로 자리 잡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나아가 신중도에 표현된 선신 가운데 하늘 세계를 대표하는 제석천, 지상의 중심 신인 위태천, 명부의 신인 현왕(염마라왕)이 어떻게 신중도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 신중도 속 다양한 신상(神像)의 정체를 밝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신중도에 수용 정착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 탐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중이 우리나라 신중도에 수용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시대 신중신앙이 불교경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요소를 폭넓게 수용한 결과로 여동빈 ‧ 종리권 ‧ 철괴리 같은 도교 신선, 문배(門排)의 문신,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조왕신 등이 신중도에 차용됐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도상 연구의 디테일도 돋보인다. 관성제군, 즉 《삼국지》 영웅 중 한 명인 관우의 도상을 조왕신 표현에 차용한 사례나 관본류 도상의 광범위한 참조가 면밀하게 검토돼 있다. 이외에도 《서유기》모티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다면다비(多面多臂)의 예적금강이 천수관음 도상과 《석씨원류응화사적》삽화 등 다양한 요소를 참조해 조선 후기 신중도에서 혁신적으로 형상화됐음을 유형 비교로 보여준다.
결국 신중도는 조선시대 불화 가운데 한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우리나라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돼 만들어진 창의적 산물임을 드러낸다.
-김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