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 29회.-불각사에서 다시 불각(佛覺)을 이루다
“고요하면 천 가지, 움직이면 하나도 없네.”
보우 스님은 바랑을 챙기고 감로사를 나와서 발길을 닿는 대로 걷다가 개성 인근의 한 사찰 앞에 섰다. 불각사(佛覺寺)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불교는 지혜와 자비라는 법륜(法輪)으로 굴러가는 수레가 아니겠는가? 혼잣말을 삼키고 보우 스님은 불각사 경내를 둘러본 뒤 주지실로 향했다.
보우 스님과 불각사 주지는 맞절을 한 뒤 통성명을 했다. 언뜻 봐도 주지스님은 수행력이 높지 않아 보였다. 보우 스님이 자신의 법호를 대자 불각사 주지가 두 눈이 동그래졌다. 감로사에서의 기행이 이미 불각사에까지 퍼진 것이었다. 불각사 주지스님은 보우 스님에게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보우 스님은 빙그레 웃은 뒤 고함을 질렀다.
“이런 도둑놈을 봤나.”
“아니…… 어찌하여……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하십니까?”
보우 스님의 호통에 불각사 주지스님이 어쩔 줄 몰라 했다. 보우 스님이 말을 이었다.
“제 밭을 일구지 않아서 잡초만 우거진 묵정밭이 되었는데, 남의 밭에 열린 곡식만 탐내는구나. 남의 살림을 훔치려고 하는 게 도둑이 아니고 뭐냐?”
보우 스님의 말뜻을 알아들은 불각사 주지스님은 다시 일어나 삼배를 올림으로써 예를 갖췄다.
주지스님은 직접 보우 스님이 머물 수행처를 안내했다. 보우 스님은 기와지붕을 얹은 당우들을 마다하고 가장 외지고 허름한 요사채를 선택했다. 기둥이 기울어서 위태로워 보이는 요사채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보우 스님의 한 몸을 간신히 눌 수 있는 크기였다.
보우 스님은 요사채에서 두문불출하고 《원각경(圓覺經)》을 읽었다. 26세에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한 뒤 오히려 보우 스님은 불경 읽기를 멀리했다. 보우 스님은 불경이 ‘토끼 잡는 덫’이나 ‘물고기 잡는 통발’에 불과해 보였다.
불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었다. 명창이 되려면 부지런히 목청을 가다듬어서 자신만의 소리를 지녀야 했다. 남의 소리를 듣고서 잘 불렀네, 못 불렀네, 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귀명창에 지나지 않았다. 보우 스님이 애써 불경 읽기를 멀리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용문사 상원암에서 세상에서 쫓겨난 가엾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정진하면서 보우 스님은 성불(成佛)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고, 성불에 이르는 길에는 큰길과 샛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서(城西)의 감로사에서 용맹정진한 끝에 보우 스님은 불조(佛祖)와 산하(山河)를 입도 없이 한입에 삼키는 체험을 하였다. 보우 스님의 초견은 세상의 모든 양변을 여읜 자리를 체득한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더는 경전을 멀리할 이유가 없었다.
《원각경》은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당시 고려에는 북인도의 승려인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한 《원각경》이 유통되고 있었다. 보우 스님이 《원각경》에 관심을 가진 이유 보조 지눌 국사가 신봉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이다.
《원각경》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두 보살과 문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우 스님은 《원각경》을 읽다가 ‘문수보살장’과 ‘금강장보살장’에서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물었다.
“수행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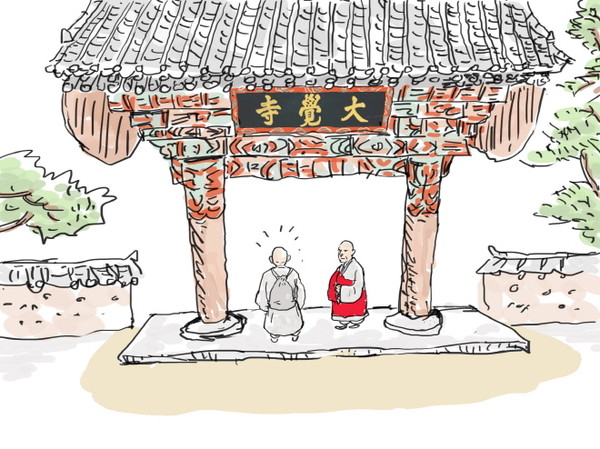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은 눈병이 나서 허공에 핀 꽃과 달을 보는 것이다. 실제 허공에는 꽃이 없는데 눈병으로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니 이런 잘못된 생각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꿈과 같아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바른 깨달음으로 바라보면 허공의 꽃은 원래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질 일도 없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허공의 꽃을 보고 슬픔과 기쁨에 빠지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다 버려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수보살의 질문만큼이나 금강장보살의 질문도 인상 깊었다.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한 존재라면 어찌하여 일체의 무명(無明)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무명을 본래 지니고 있다면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본래성불을 설하셨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불도(佛道)를 이룬 뒤에도 무명(無明)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켰습니까?
금강장 보살의 질문은 보우 스님이 평소 궁금했던 것이기도 했다.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갖고 태어났다면 굳이 무명(無明)의 길을 헤맬 이유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본래 모든 중생의 마음이 무명이라면 굳이 여래께서는 본래성불을 설할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성불과 무명은 어머니의 뱃속에 함께 있는 쌍둥이와 같았다. 성불을 이룬 뒤에도 얼마든지 무명의 미혹(迷惑)이 마음을 덮칠 수 있었다. 초견을 이룬 뒤여서 보허 스님은 깨달음을 어떻게 지키고 진작시킬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강장 보살의 질문에 대한 여래의 대답은 실로 심오하였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고 원각(圓覺)을 분별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유전(流轉)과 같다. 이는 구름이 빨리 가면 달이 움직이듯, 배가 나아가면 언덕이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다. 흐름이 쉬지 않으니 사물이 먼저 그칠 수 없다. 윤회하는 생사의 더러운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원각(圓覺)을 보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비유하면 환영의 가리개로 망령되이 허공의 꽃(空華)을 보게 되니, 환영의 가리개가 제거되어도 이 가리개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리개와 꽃, 이 두 가지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생사열반(生死涅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신묘한 깨달음은 세상을 두루 비추니 허공의 꽃과 가리개에서 벗어나게 한다. 허공은 잠시 있지도 않고, 잠시 없지도 않다. 여래의 원각수순(圓覺隨順)은 허공의 평등본성(平等本性)이다. 금광을 녹여서 이미 금이 되었다면 다시는 금광이 되지 않는다.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 금의 성질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즉 본래 성취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여래의 원각(圓覺)도 이와 같다. 여래의 원각심(圓覺心)에는 성불함도 성불하지 못함도 없다. 사유심(思惟心)으로 여래의 원각경계를 측량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는 반딧불(螢火)을 취하여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런 연유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먼저 윤회(輪廻)하는 근본(根本)을 끊으라고 설하는 것이다. 모든 육진(六塵)은 망상에 따른 기운일 뿐 실제 마음의 바탕이 아니다. 이런 사유로 부처님의 경계를 분별하면 오히려 허공의 꽃이 다시 허공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 망상만 만들 테니 옳은 처사가 아니다. 허망하게 들뜬 마음은 교묘한 견해가 많아 원각방편(圓覺方便)을 성취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분별(分別)은 바른 물음이 되지 않는다. 금강장 보살아, 마땅히 알라.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범부(凡夫)와 제불(諸佛)이 허공의 꽃과 같고, 사유(思惟) 또한 환화(幻化)와 같다. 만약 이를 깨달으면 그런 후에 원각(圓覺)을 얻으리라.”
보우 스님은 “모든 것이 다해 없어지면 그것을 부동이라 한다(一切盡滅 名爲不動)”는 구절에 이르러 독의 밑이 빠져서 일시에 독에 담긴 물이 빠지듯이 마음속 알음알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아 지혜의 빛이 환히 비추면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는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보우 스님은 자신이 체득한 경계를 글로 옮겨 졌었다. 연지에 고인 묵즙에 붓을 담갔다. 붓은 종이 위에서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고요하면 천 가지로 나타나고
움직이면 하나도 없구나.
없다, 없다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서리 온 뒤에는 국화가 활짝 피겠구나.
보우 스님은 불각사에서 다시 한번 불각(佛覺)을 이뤘다. 언젠가부터 보우 스님에 대한 소문이 개성 전체에 퍼졌다. 스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보우 스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