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 27. 초견의 오도송을 읊다
감로사 주지스님이 누워있는 보허 스님의 입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떨어뜨렸다. 물을 받아먹으면서 보허 스님은 지금 누워있는 곳이 바로 감로사(甘露寺)임을 깨달았다. 물맛은 실로 달다고밖에 달리 형용할 말이 없었다.
보허 스님은 자신이《불설비유경(佛說譬喩經)》에 등장하는 안수정등(岸樹井藤) 일화의 사내처럼 느껴졌다. 안수(岸樹)는 강기슭 언덕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일컫고, 정등(井藤)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넝쿨을 일컫는다. 안수도, 정등도 그 아래에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낭하만이 있을 뿐이다.
안수정등 일화는 아래와 같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사나워 보이는 호랑이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있는 힘껏 도망쳤다. 그러다가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끝에 다다랐다. 더는 도망칠 데가 없었다. 다행히 절벽 끝에는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줄기가 절벽 아래 우물로 늘어져 있었다.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호랑이의 공격을 피해 살 수 있었기에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그네는 등나무 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바닥에는 독사들이 고개를 쳐들고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나그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넝쿨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넝쿨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가면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갉고 있었다. 실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넝쿨을 붙잡고 있는 팔은 점차 힘이 빠져 가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려는 순간, 나그네의 벌린 입안으로 달콤한 꿀물이 떨어졌다. 나그네의 머리 위에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그네는 이제 곧 죽는다는 두려움도 잊은 채 벌들이 떨어뜨리는 꿀물의 달콤함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그네는 달콤한 꿀맛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조차 잊고 말았다.
안수정등 일화 속 광막한 들판은 무명(無明) 세계를 비유한 것이고,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호랑이는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한 것이다. 검은 쥐와 흰쥐는 낮과 밤을, 나그네의 입안에 떨어지는 꿀은 오욕락(五慾樂)을 의미한다.
보허 스님은 물 한 바가지를 다 비운 뒤 허리를 곧추세우고 앉았다. 뭔가 예전과 달리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안수정등 일화는 어떻게 하면 넝쿨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를 일러주는 게 아니었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중생의 혀끝에 떨어지는 꿀물이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한 오욕락이라면, 수행자의 혀끝에 떨어지는 꿀물은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깨닫는 선미(禪味)이리라. 이 사실을 명징하게 깨닫고 나니 꿈속에서 푸른 옷의 동자들이 줬던 감로수와 감로수 주지스님이 준 우물물이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보허 스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견(初見)의 오도송(悟道頌)을 읊조리고 있었다.
일역부득처(一亦不得處) 답파가중석(踏破家中石)
회간몰파적(回看沒破跡) 간자역기적(看者亦己寂)
요요원타타(了了圓陀陀) 현현광삭삭(玄玄光朔朔)
불조여산하(佛祖與山河) 무구실탄각(無口悉呑却)
무엇 하나 얻을 것이라고는 없는 곳
이 집안의 돌을 밟아 깨트렸네.
돌아보면 깨뜨린 흔적도 없고
이를 지켜보는 나조차 없네.
그윽하게 둥근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
찬란히 빛나는 광명이어라.
부처님과 조사님과 산하대지를
입 없이도 모두 삼켜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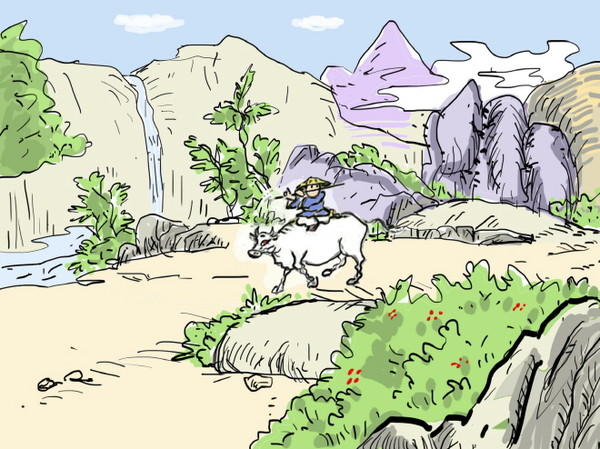
보허 스님이 깨달은 것은 본래 고요한 세계였다.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말로써 표현되나, 어떤 현란한 수사(修辭)로도 형용될 수 없는 세계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그 세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고, 그 집안의 가장 굳센 돌을 밟아 깨트려도 깨뜨린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입 없이도 부처님과 조사님과 산하대지를 모두 삼켜야 볼 수 있는 그 세계는 그윽하게 둥근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니 그저 찬란히 빛나는 광명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허 스님은 출가해 삭발염의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서 정진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 갔다. 보림사 방장스님은 보허 스님에게 선미를 맛보게 한 선지식이었다. 하지만 화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지랑이와 같았다. 깨달음은 간구하면 할수록 멀어져갔다. 화두의 갈증을 견디지 못한 보허 스님은 불경에 눈을 돌려야 했다. 화엄선에 급제할 만큼 불경 공부에 매진했으나 경전을 읽을수록 남의 보물을 만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경전은 산짐승을 잡는 덫이나 물고기를 잡는 통발에 불과했다. 보허 스님이 경전을 덮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보허 스님에게 진정한 스승은 은사인 광지 스님도 아니고, 타성적 사고의 틀을 깨트려준 보림사 방장스님도 아니었다. 용문사 상원암에서 만난 어딘가 한 군데씩 아픈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 아프다는 이유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보허 스님은 12대원을 세울 수 있었다. 염불을 하는 동안 보허 스님은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염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구했다. 용문사 상원암을 떠나서 성서(城西)의 감로사로 온 뒤 만법귀일 일귀하처, 즉, 모든 법이 하나로 귀결돼 돌아가는 그 자리를 찾고자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보허 스님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각(大覺)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화두를 타파하고자 정진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정진하다가 보허 스님은 정신을 잃고 쓰려졌고 꿈속에서 푸른 옷의 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푸른 옷을 입은 두 명의 동자는 보허 스님이 화두를 풀기 위해 마음속으로 지어낸 허구의 환영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 동자가 건넨 감로수를 마신 뒤 보허 스님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것 같은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보허 스님은 자신의 두 눈을 감싸고 있던 망념의 막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운무(雲霧)가 걷힌 산 정상에서 산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돌아보건대 자신의 두 눈을 어둡게 했던 망념의 막은 깨달음을 얻고자 조급한 집착이었다.
보허 스님은 푸른 옷을 입은 동자들이 건넨 감로수와 감로사 주지스님이 건넨 우물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전과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보배를 지니고 있다. 불성(佛性)이라는 보배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구족(具足)돼 있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미혹한 중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칠흑 같은 무명세계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불조(佛祖)와 산하(山河)를 입도 없이 한입에 삼킨 것 같은 초견을 경험한 뒤 보허 스님은 3조 승찬 스님이 지은 《신심명(信心銘)》의 한 구절을 읊조렸다.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혐간택(唯嫌揀擇)
단막증애(但莫憎愛) 동연명백(洞然明白)
지극한 이치는 어려울 게 없으나 다만 이렇다 저렇다 가리지 않으면 되는 것. 좋으니 싫으니 가리는 마음만 없으면 하늘의 밝은 달처럼 두루 빛나리라.
보허 스님이 체험한 초견의 세계는 옳고 그름도, 좋고 싫음도, 성스럽고 속됨도 없는 그야말로 여여(如如)한 세계였다.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