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고 2.
아침공양 상을 물리고 온 시좌의 낯바닥에 근심이 깊게 어렸다.
“왜 그러느냐? 네 얼굴에 불보살님들은 보이지 않고 마군(魔軍)들만 보이니.”
태고 선사의 물음에 시좌가 깊은 한숨을 내뱉은 뒤 대답했다.
“어른 스님, 여름이 다 가도록 연못에 연꽃들이 피지 않아서 괴이하다 했는데……”
태고 선사는 말을 잇지 못하는 시좌를 다그쳤다.
“헌데?”
“한파가 몰아치지 않는 겨울의 초입인데도 소나무들이 말라죽었습니다. 암자 뒤편을 살펴보니 소나무 네 그루가 모든 가지들을 떨구고 나목(裸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괘념치 말아라. 니전(泥田)의 연꽃들이야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다시 처염상정의 향기를 퍼뜨릴 것이고, 뒷산의 소나무들이야 유정물(有情物)로서는 시절인연을 다한 것이니 무정물(無情物)의 재목(材木)으로 쓰면 될 것이고…….”
태고 선사가 말하는 내내 연신 머리를 조아리더니 시좌는 밥상을 들고서 종종 걸음으로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산문(山門)에 들던 때가 떠올라서 태고 선사는 ‘처염상정(處染常淨) 화과동시(花果同時)’이라는 말이 혀끝에 맴돌았다. 그 의미인즉슨 진흙에서 자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은 본성을 지녀 향기로운 꽃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 원인과 결과를 함께 가지며 현재 일어나는 일 속에 미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점심공양을 거르고 좌선수행을 마치고 나니 방문 앞에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열고 보니 허공에 진눈깨비들이 난분분 흩날렸다. 부는 바람에 어지러이 떠도는 진눈깨비들을 보고 있으려니 태고 선사는 시야가 흐려졌다.
‘저 설화(雪花)들은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소겁 동안 불도(佛道)를 이루지 못하시자 범천왕들이 항용 공양하였다는 하늘 꽃이려나, 아니면 혼침한 유위상(有爲相)의 업장(業障) 때문에 본래 붙을 데가 없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허공 꽃이려나. 하늘 꽃이거나 허공 꽃이거나 아무려나.’
“어른 스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좌의 말을 듣고 보니 시좌의 뒤에 키가 훤칠하게 용모가 수려한 수좌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무학(無學)이었다.
무학이 방으로 들어와 예를 갖춰서 삼배를 올리자 태고 선사도 맞절을 했다.
“법체(法體) 강녕하셨는지요? 스님.”
무학의 인사에 태고 선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일세.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지.”
일면불 월면불은 중국의 마조(馬祖) 대사가 남긴 공안(公案)이었다. 이 공안은 원주스님이 문안 인사를 와서 건강 상태를 묻자 마조 대사가 한 대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면불과 월면불은 《삼천불명경(三千佛名經)》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이다. 일면불은 1800세나 살았고, 월면불은 하루 밤낮동안만 살았다. 마조대사의 대답은 가장 장수한 부처님과 가장 단명한 부처님을 대비시켰던 것이다.
무학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주(趙州)선사처럼 12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야지요.”
“조주선사가 말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미친 사람이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물며 평생 공양만 축내고 살아온 이 빈도(貧道)가 후학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겠는가?”
“겸양(謙讓)이 지나치십니다.”
“먼 길 왔을 터이니 조주선사의 가르침대로 차나 한잔 하세.”
태고 선사는 풍로에 찻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어 찻잔에 나눠서 따랐다.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시고나서 태고 선사가 입을 뗐다.
“바랑에 이미 보배를 지닌 무학화상이 살림살이랄 것도 없는 이 빈도에게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일미청정(一味淸淨)이군요. 차 맛이 일품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입안은 물론이고 가슴속까지 개운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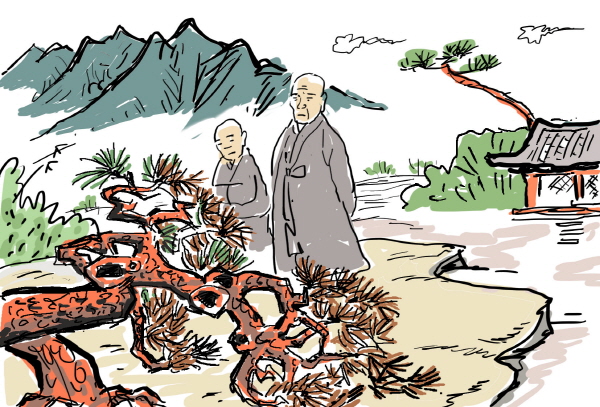
무학이 딴청을 부리고 나서야 찾아온 속내를 밝혔다.
“국사께서 선왕께 남경(南京)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태고 선사는 무학이 찾아온 이유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무학은 남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남경 터가 주목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숙종1년에 이미 김위제가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지. 김위제가 남경 천도를 주장한 근거는 도선(道詵) 스님의 비기(秘記), 즉, 풍수지리(風水地理)와 도참(圖讖)사상이었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이유로 묘청(妙淸) 스님은 서경(西京)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네. 도선스님의 비기가 두 개일 리는 없지 않은가? 비기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지. 개경의 기운이 쇠락(衰落)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한편에서는 남경을, 다른 한편에서는 서경을 새로운 수도로 봤던 것이네. 묘청에 이어서 신돈(辛旽)도 서경에 가서 지세를 살펴보았지. 신돈은 충주로 천도할 것을 주청하기도 했네. 내가 보기에 풍수지리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서경은 고구려의 도읍지였고, 남경의 초기 백제의 도읍지였으니 서경, 남경 모두 길지임은 분명했네. 만약 국경선 너머까지 국토를 넓힐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닌 상황이라면 서경이 더 도읍지로 적합했을 테지. 내가 남경 천도를 주장한 이유는 고려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황해와 인접해 중국과의 교역이 편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네. 내가 삼각산 중흥사(中興寺)과 태고암(太古庵)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석하면서 살펴보니 남경은 산을 등지고 강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더군. 산세로 보면 동으로 낙산, 서로 인왕산, 남으로 남산, 북으로 백악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내사산(內四山)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동으로 용마산, 서로 덕양산, 남으로 관악산, 북으로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외사산(外四山)을 이루고 있는 명당보국의 형국이었네. 물줄기로 보면, 청계천이 남경을 감싸 안으면서 한강과 합류하면서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남경지역을 두루 만행하면서 도선스님의 제자인 여철(如哲) 스님이 삼각산 승가굴을 중심으로 남경 일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도선 스님의 비경에 적합한 천도지역이 남경이라고 봤던 것이네. 하지만 왕이 다스리기 좋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어딘들 상관있겠나? 내가 실로 바랐던 것은 좁게는 용문산에서 삼각산까지, 넓게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민가의 헐벗은 백성들을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을 뿐. 기실, 풍수도참은 선법(禪法)을 따르는 우리 운수납자들에게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지 않은가?”
무학이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뗐다.
“선왕께서 봉은사에 가서 태조 진전에 참배한 뒤 남겨 터를 살펴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지. 이제현을 보내서 궁궐터를 살펴보게 한 것은 물론이고, 궁궐을 축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 그런데 윤택 등 유생들이 반대하니 그 뜻을 실현할 수 없었네. 내가 풍설(風說)에 전해 듣기로는 무학화상이 나옹(懶翁) 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삼산양수(三山兩水)의 길지를 찾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원나라의 지공(指空) 스님께 받은 삼산양수기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삼소(三蘇)에 궁궐을 창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소조성도감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네.”
“왕도 한양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무학은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말을 끊었다. 태고 선사는 무학이 잇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천도된 궁궐의 주인은 고려왕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리라. 태고 선사는 못들은 척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다.
“나옹 선사가 남긴 법어와 글들은 후학 중 누가 정리하고 있는가?”
무학이 앞니가 드러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스승이 살아계실 때에 상당법어(上堂法語), 착어(着語), 수문(垂文), 서장(書狀)을 각연(覺璉)이 집록(輯錄)하고 혼수(混修)가 교정하여 간행하긴 했으나 그 문장이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른 스님의 문집도 후학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고 선사는 다담(茶談)이 끝났으니 그만 일어서라는 의미로 찻상에 놓인 찻잔을 천으로 닦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내 글이야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개울물에 쓴 것이고, 소나기가 내려서 너럭바위에 쓴 것이고, 새들이 날아가면서 허공에 쓴 것과 같으니 쓰자마자 지워지는 것으로 족하니 후대에 남길 것이라곤 없네. 이 빈도의 행장이라야 그저 청산(靑山)에 걸린 한 조각의 백운(白雲) 같은 것이니 흩어지면 그뿐.”
무학이 떠난 뒤 태고 선사는 소설암(小雪庵) 경내를 거닐었다. 시좌의 말대로 소나무 여러 그루가 솔잎이 누렇게 뜬 게 말라 죽은 상태였다. 소나무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벌레들에 의해 고사된 게 아닐까 싶었다. 죽은 소나무들이 고려의 운명처럼 여겨져서 태고 선사는 가슴 한 편이 아렸다.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