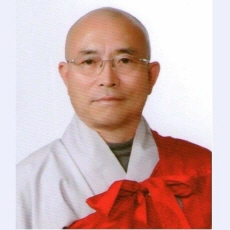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願共法界 諸衆生 自他一時 成佛道)는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다같이 부처님이 됩시다라고 하는 말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부처의 길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자리의 표현이다.
선종에서는 심즉불(心卽佛)이라 했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뜻이다. 그러면 내곁에 계신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 볼수 있을까? 어떻게 성불할 수 있을까? 성불의 수행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이지 않는 질문 속에서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의문의 시작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진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수행의 과정은 보살행이다. 보살행이란 부처가 되기 위한 자리이타(自利利他) 행이다. 경전에는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친다. 보살행이란 육바라밀이다. 즉 보살의 실천행인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의 여섯 가지의 실천행을 말한다. 첫 번째 보살행으로서의 보시란 널리 베푼다는 뜻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한다. 재물로 베풀어주는 재시(財施),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외시(無畏施) 등이 있는 데 이를 삼종시(三種施)라 한다.
두 번째 지계(持戒)행으로써 부처님이 말씀하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5계와 스님의 계율 250가지가 있다.
세 번째 보살행으로 인욕이란 이 세상의 온갖 모욕과 고통ㆍ번뇌를 참으며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떻게 인욕(忍辱)을 수행하는가? 타인의 괴롭힘을 참으며 보복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해관계, 비난과 명예, 칭찬과 희롱,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참고 견디어낸다.
네 번째 정진(精進)으로 사람이 신심(信心)으로 수행하였으나, 선세(先世)의 죄업과 장애들이 있기에 이를 소멸하기 위해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부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선정(禪定)은 마음이 산란하여 헐떡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다. 망념과 사념(邪念)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면 이 세상이 곧 극락이고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다. 이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선 선정(禪定)을 닦아야 한다.
여섯 번째 지혜(智慧)다. 지식(知識)은 바깥에서 들어오지만 지혜(智慧)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고 텅텅 비우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계, 정, 혜 삼학(三學)이다. 청정하고 맑은 생활습관을 '계'라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정'이라 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혜'라고 한다.
이러한 육바라밀과 삼학을 실천해 나아가면 부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정진해 나아가자.
-세종충남교구 종무원장ㆍ광천 관음사 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