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무렵이다. 나는 퍽 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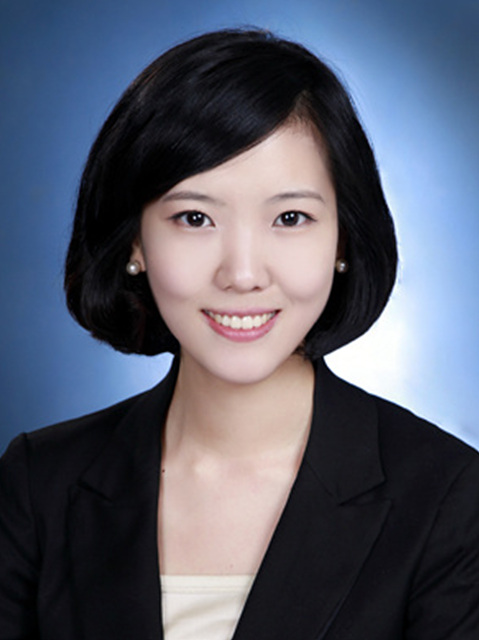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과 육아에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분주히 달려가는 동안, 나는 인생의 즐거움도, 삶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탓인지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면 이번엔 어디로 피난을 떠날지 계획하며 즐겁지 않은 명절을 보내야 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았다. 그렇게 추석을 앞두고 나는 선암사로 향했다.
이른 아침, 추적추적 보슬비가 내렸다. 명절을 맞아 집에 오신 친척 어른들을 뒤로한 채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머릿속의 고뇌와 잡념들을 내려놓기를 기대하며 처음으로 접해보는 템플스테이인만큼 조금은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선암사행 기차에 올랐다. 순천역에서 한 시간여 남짓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절 입구에 다다랐다. 비에 젖은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니 승선교가 보였고, 오르막 자갈길을 지나니 선암사 입구가 보였다.
오래된 절 곳곳에 빛바랜 단청과 600년을 살아냈다는 매화나무 몇 그루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방사를 배정받고 나니, 비로소 내가 정말 깊은 산속 절에서 3박4일을 보내야 한다는 실감이 났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 좋았다. 새벽예불을 드리고, 연등도 만들고, 염주 한 알 한 알에 나의 외로움을 꿰어 108 염주도 만들어 보았다. 템플스테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날. 나는 노스님께 길을 묻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묵묵한 수행공덕으로 외로움이란 것엔 익숙할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칠흑처럼 컴컴한 밤바다 한가운데 나 홀로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삶은 고해라고 하는 걸까?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날들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너무 두렵고 외로웠다. 슬기롭게 고해를 헤쳐나가기 위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스님은 나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않으셨다. 그저 외로움을 일찍 알아버린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허허 하고 웃으셨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 실망한 마음도 잠시,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가장한 공허함이 순간적으로 밀려들었다. 온 생을 바쳐 수행을 쌓아도 한 사람의 영혼의 외로움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순간 스님의 모습이 나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긴 세월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스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던 걸까. 아님 스스로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났던 걸까. 그건 아마 600여 년의 세월 동안 봄마다 꽃피고 지길 반복했던 매화나무나, 긴 세월 동안 빛바래고 벗겨진 단청이 말해주듯 노스님의 오래고 고독한 수행의 시간처럼 오래된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시간을 쌓으며 흐릿하지만 계속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돌아오는 날은 왔던 날과는 다르게 맑은 햇살이 비추었다. 템플스테이에 오기 전, 마음을 비우고 돌아가고 싶었던 바람과는 다르게 뭔가를 양손 가득히 들고 돌아가는 귀성길처럼 내 마음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최미연(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